|
|
|
|
|
|
|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
● 현대어 풀이
이 몸이 태어날 때에 임을 따라서 태어나니 /
한평생을 살아갈 인연이며,
이것을 하늘이 모르겠는가. /
나 오직 젊었고 임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곳이 다시
없구나. /
평생에 원하되 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였더니
/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
엊그제는 임을 모시고 궁전에 올라 있었는데 /
그 동안 어찌하여 속세에 내려와 있는가. /
내려올 때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삼년이라.
/
연지와 분이 있지만 누굴 위해 곱게
단장하겠는가. /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서 /
짓는 것이 한숨이요, 흐르는 것이 눈물이구나.
/
인생은 유하한데 근심은 끝이 없다. /
무심한 세월의 순환이 물 흐르듯 빨리
지나가는구나. /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의 바뀜이
때를 알아 갔다가는 다시 오니 /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많기도
하구나
● 현대어 풀이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녹여 헤쳐내니
/
창 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송이 피었구나.
/
가뜩이나 차갑고 변화 없이 담담한데
매화는 그윽한 향기까지 무슨 일로 풍기고
있는가. /
황혼의 달이 쫓아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
흐느껴 우는 듯, 반가워하는 듯하니
이 달이 임인가 아닌가. /
저 매화를 꺾어 내어 임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 현대어 풀이
꽃이 떨어지고 새 잎이 돋아나니
푸른 녹음이 우거져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
비단 휘장은 쓸쓸히 걸렸고
수놓은 장막 안은 텅 비어 있구나. /
연꽃 무늬가 있는 방장을 걷어놓고
공작 병풍을 두르니 /
가뜩이나 근심걱정이 많은데
하루 해는 어찌 이렇게 길고 지루하기만 할까.
/
원앙 그림의 비단을 베어놓고 오색실을 풀어
내어서 /
금으로 만든 자로 재어서 임의 옷을 만드니 /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격식까지 갖추어져
있구나/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함 안에 옷을
담아 놓고 /
임에게 보내려고 임이 계신 곳을 바라보니 /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
천만 리나 되는 머나먼 길을 누가 감히
찾아갈까. /
가거든 이 함을 열어두고 나를 보신 듯이
반가워 하실까?
● 현대어 풀이
하룻밤 사이에 서리가 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에 /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렴을 걷으니 /
동산에 달이 떠오르고 북쪽 하늘에 별이 보이니
/
임이신가 하여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나는구나. /
저 맑은 달빛과 별빛을 모두 모아서
임 계신 곳으로 부쳐 보내고 싶구나. /
그러면 임께서는 그것을 누각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을 다 비추어서 /
깊은 두메 험한 산골짜기까지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 현대어 풀이
생기가 막혀 흰눈이
일색으로 덮여 있을 때 /
새의 움직임도 끊어져 있구나. /
소상강
남쪽 둔덕과 같이 따뜻한 이곳도 이처럼
추운데 /
북쪽의 임이 계신 곳은 말해 무엇
하리. /
따뜻한 봄기운을 활활 부쳐 일으켜
임 계신 곳에 쬐게 하고 싶어라.
/
초가집 처마에 비친 따뜻한 햇볕을
임 계신 곳에 올리고 싶어라. /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 /
해는 저물었는데 길게 자란 대나무에
기대어서
보니, 헤아려보는 여러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
짧은 해가 이내 넘어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 /
청사초롱을 걸어놓은 곁에 전공후를 놓아두고 /
꿈에서나 임을
보려고 턱을 바치고 기대어 있으니 /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기도 하구나.
이 밤은 언제나 다 할 것인가?
[ 결사 ]
● 현대어 풀이
하루는 열두 시간, 한 달은 서른 날, /
잠시라도 임 생각을 하지 말아서 이 시름을
잊으려 하니 /
마음 속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
편작 같은 명의가 열 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찌하리. /
아, 내 병이야 이 임의 탓이로다. /
차라리 죽어 호랑 나비가 되리라. /
그리하여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마다 앉았다가
/
향기 묻힌 날개로 임의 옷에 옮아가리라. /
임이야 그 호랑나비가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끝까지 임을 따르려 하노라.
이 노래는 송강이 50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물러난 4년간 전남 창평으로 내려가 우거(寓居)하며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작품으로, 뛰어난 우리말의 구사와 세련된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시상 전개상의 특징으로 4계절의 경물
변화와 그에 따른 사모의 정을 읊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임금을 사모하는 신하의 정성을, 한 여인이 그
남편을 생이별하고 그리워하는 연모의 정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체의 내용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 변화에 따라 사무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작품의 서두와 결말을 두고
있어서, 모두 여섯 단락으로 구분된다. 외로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심경은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결같음을 볼 수 있다.
■ 연대 :
선조 18 ~ 22년(1585 ~ 1589)
■ 갈래 :
■ 배경 :
■ 성격 :
■ 표현 :
■ 구성 :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 (本詞는 春, 夏, 秋, 冬으로
됨)
1. 서사 → 임과의 인연 및 이별 후의 그리움과 세월의
무상감
2. 본사(春怨) → 매화를 꺾어 임에게 보내드리고 싶음.
3. 본사(夏怨) → 임에 대한 알뜰한 정성
4. 본사(秋怨) → 선정을 갈망함
5. 본사(冬怨) → 임에 대한 염려
6. 결사 → 임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일편단심)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선교 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북한 접경에서 밥을 나누는 사역을 하시는 그분은 언젠가 냇물을 건너 식사를 하러 오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고 강을 건너 온 그들의 옷은 남루했고 옷이 얇아 많이 추워 보였습니다.
신발은 다 떨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검었습니다.
그 중 79세인 김 씨 할아버지에게서 일종의
경외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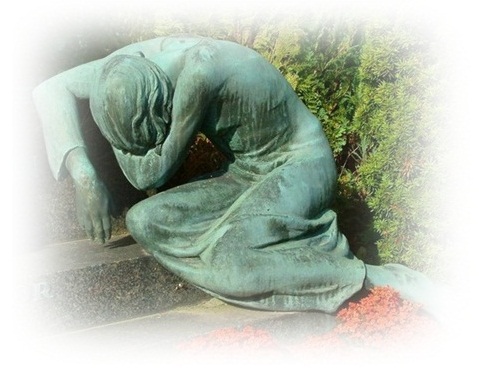
구글의 지도 촬영 팀인 Google Maps' Street View team이 배낭에 특별 카메라를 장착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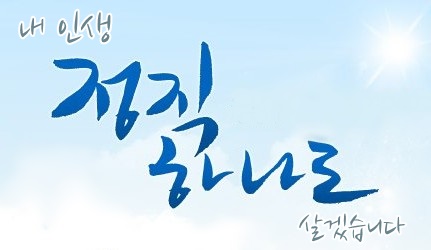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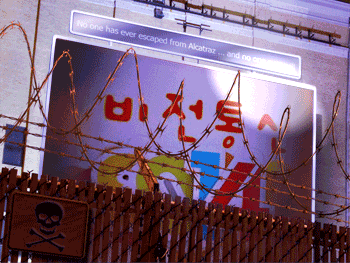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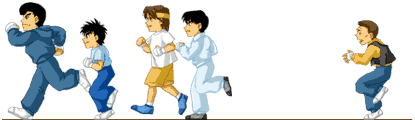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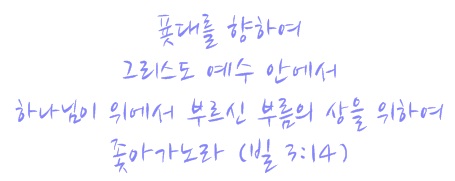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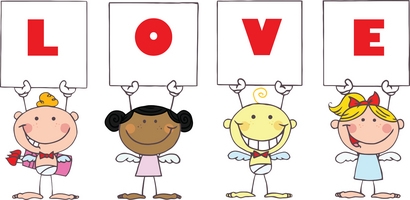
|
|

|
|
이스라엘 가정집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의 문패처럼 문설주에 부착되어 있는 손바닥 길이 정도의 작은 케이스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작은 케이스가 바로 [메주자/Mezuza]]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작은 가게의 입구에도 붙어 있습니다.
메주자 안에는 성경의 신명기 6장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6:4-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