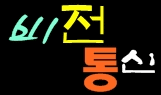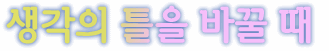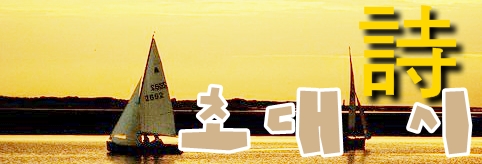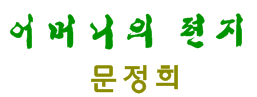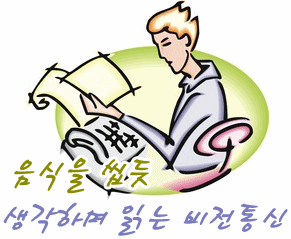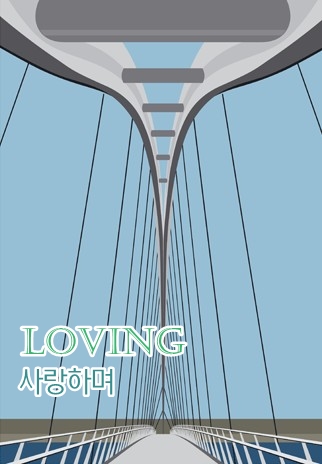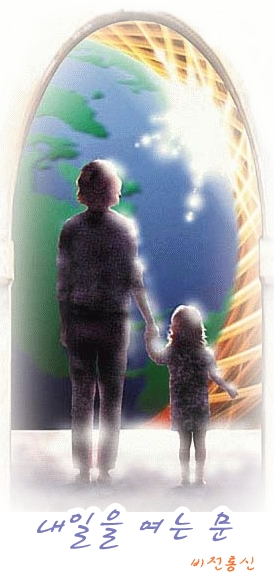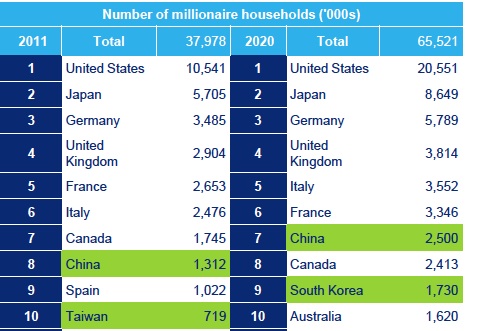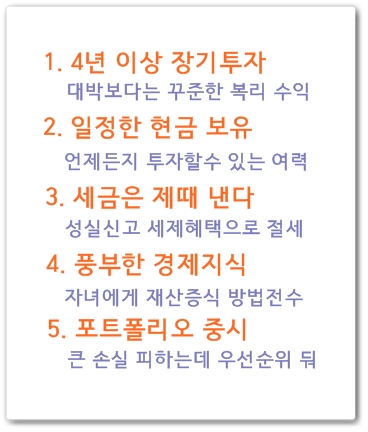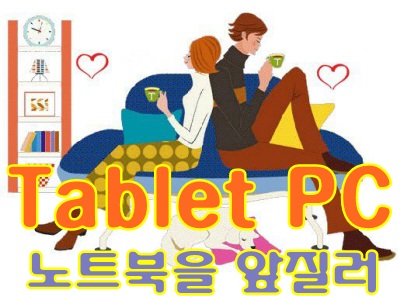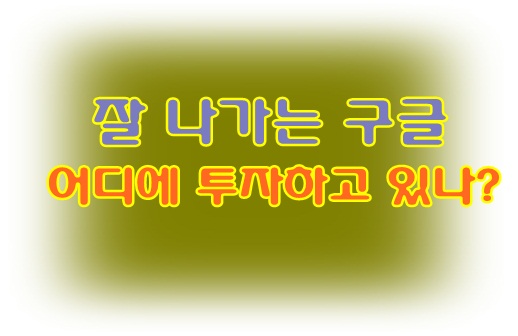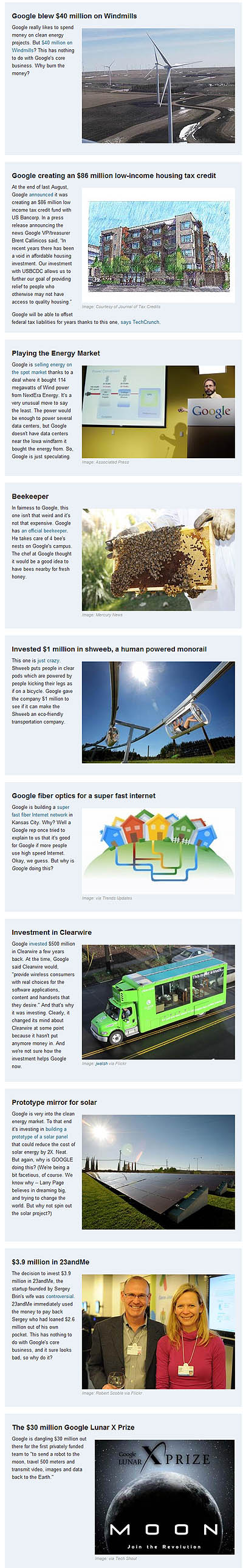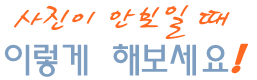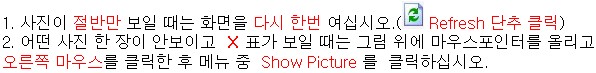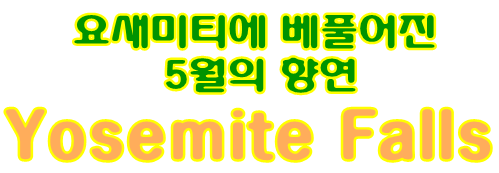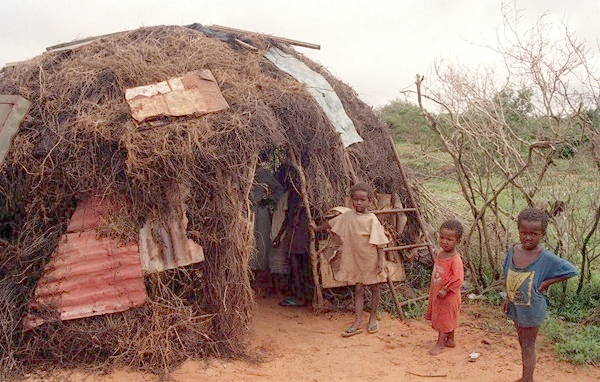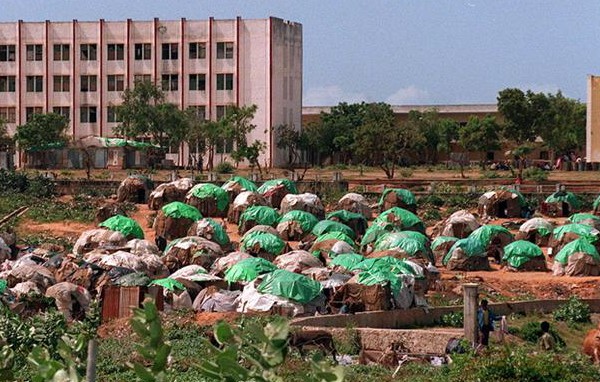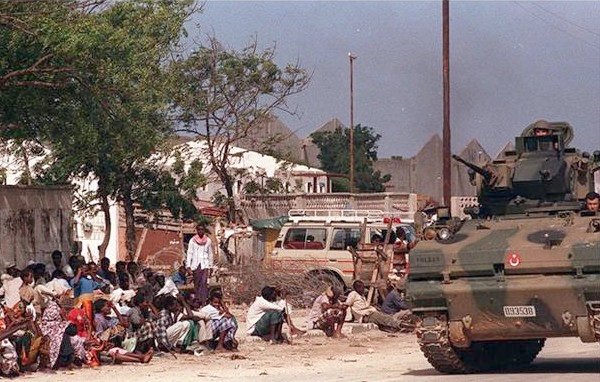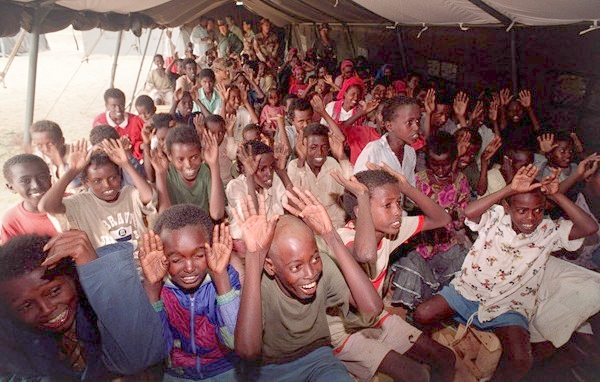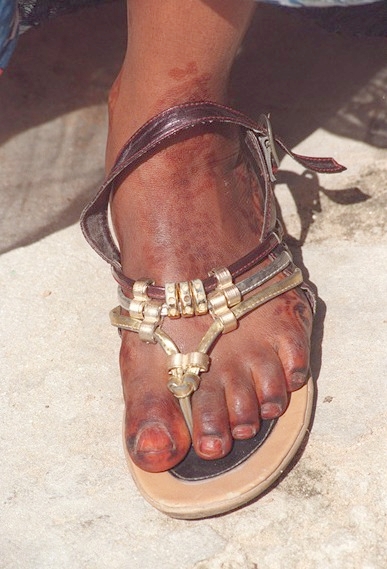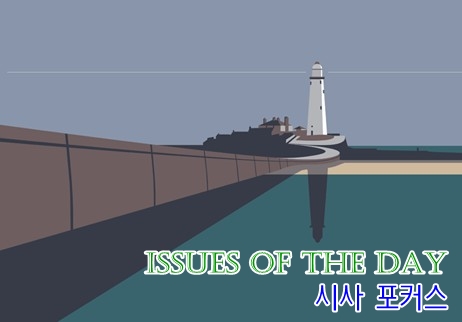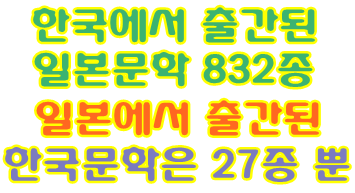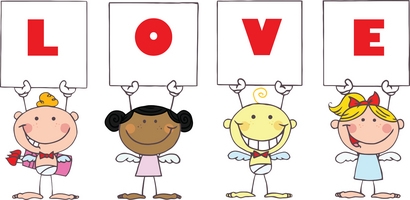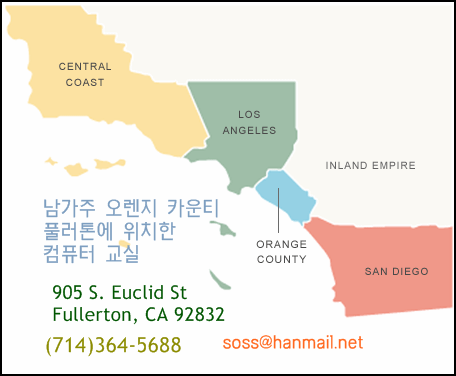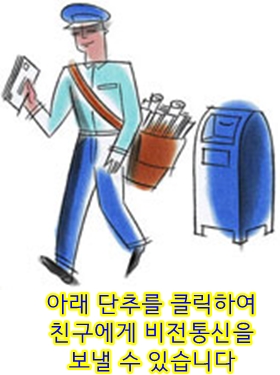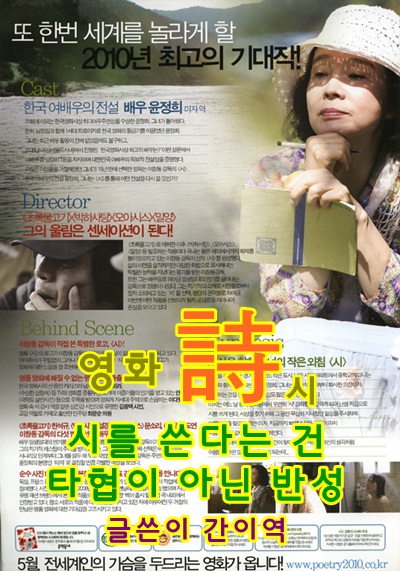
간병인으로 등장하는 60~70대 나이의 할머니가 영화 '시'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우아해 보이고 세상에 찌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찾아간 것이 시 창작 수업이었다.
그녀는 왜 시를 배우려는 것일까. 시를 써서 시인이 되기 위해서? 그녀는 그 대답을 그냥 시를 쓰고 싶을 뿐이라고 늘 마무리 짓는다.

왜 그녀가 시를 써야만 하는 것일까. 영화의 시작은 한 자식을 둔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병원에서 울부짖음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공은 한없이 그녀를 측은하게 바라본다. 그 이유는 그 죽은 여학생은 자신의 손자와 같은 학교의 여학생이었기 때문이고 그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의 손자는 같은 학교의 여학생이 죽었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그녀는 재차 묻지만 손자는 오히려 화를 낸다. 대화의 단절은 그녀에게 무엇인가로 환기시킬 원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시창작 교실을 찾았다. 시를 왜 써야 하는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채 그녀는
지금의 답답함을 풀 수 있는 통로를 '시'로 선택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떤 사내가 찾아와 그녀에게 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손자와 그 친구들이 동기의 여학생을 죽음으로 몰고간 범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녀는 그 손자의 친구 아버지들과 달리 천진난만하게 꽃을 보며 떠오르는 시구절을 수첩에 적기만 한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녀는 딱 노망난 할머니다.
그녀는 왜 시를 써야만 하는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츠하이머 말기. 시를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는데도
그녀는 시를 쓴다. 손자가 미워도 내색을 하지 못하기에 손자가 상처를 받을까 봐 그녀는
수첩에 시구절을 옮겨 적는다.

안으로 안으로 상처를 삼키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상처까지도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남자들이 피해자 부모의 불만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녀는 부끄러워서 그 피해자 부모와의 대면을 피해 버린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 폭령성을 같은 여자로서 공감하기 때문이다. 돈이면 죽은 그 여학생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그래서 더더욱 그녀에게 있어 시라는
일종의 매체는 절절하게 느껴진다.
그녀가 돌보는 환자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한 이유도 바로 이런 자기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 가 싶다. 자신의 딱한 심정을 충분히 알기에 누군가를 측은히 여기고 그를 용서한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사람은 현실에서 없다.
현실에서 누가 자기 손자를 경찰에 넘기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현실에 이런 사람이 없기에 더욱 이 영화에 나오는 할머니의 울음이 진실성을 가진다.
시낭독회에서 한 경찰신분의 회원 앞에서 서럽게 우는
그녀의 울음 속에 이 사회의 부조리한 타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쓴다는 건 타협이 아닌 반성의 공간에 들어왔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 반성을 통해 누군가는 더 상처를 받겠지만 그 상처는 분명 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따라서 누구도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주인공처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 찾아온다.
시를 쓴다는 건 그만큼 나 자신을 고쳐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내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영화 '시'의 대사에 공감한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시 그리고 시인의
시대 반성, 자기 반성을 영화 시에서 느낄 수 있었다. 맹목적인 타협은 사회를 좀먹게
하기에 요즘처럼 시를 읽지 않는 사회에서 영화 '시'는 가치가 있는 영화다.
과연 우리는 그녀처럼 시대에 대한 반성, 자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암묵적인 불의에 대한 타협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 오히려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 시를 선택한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