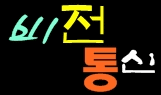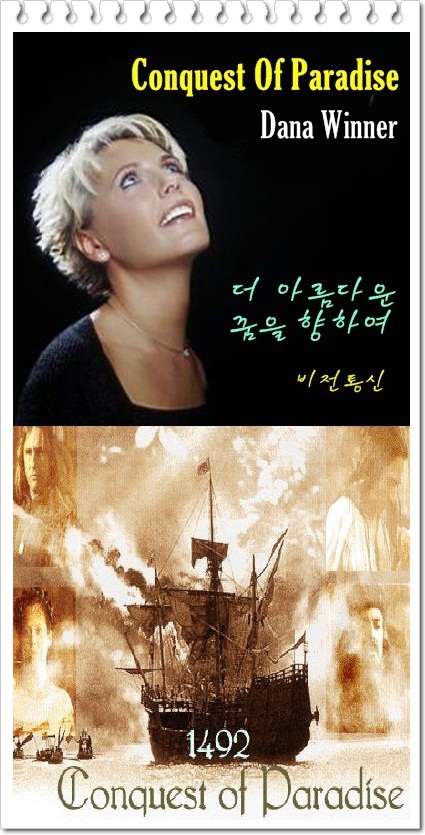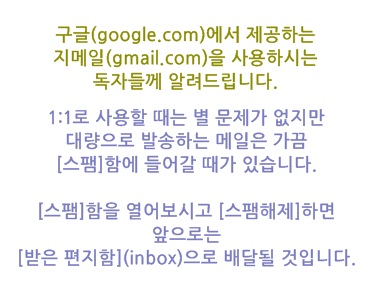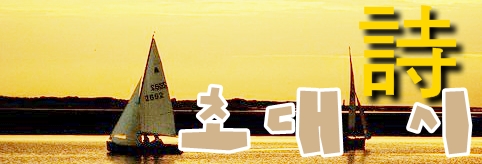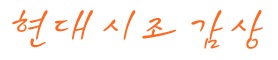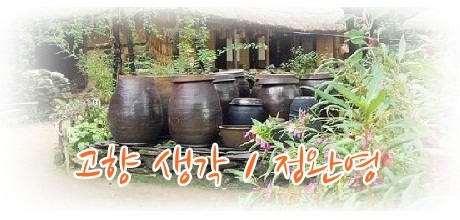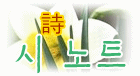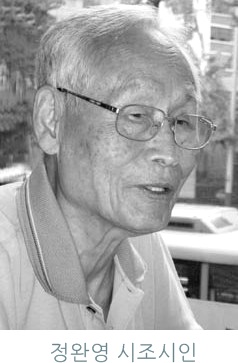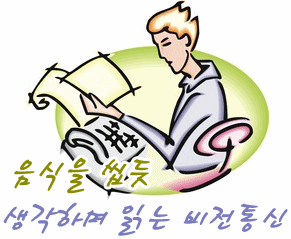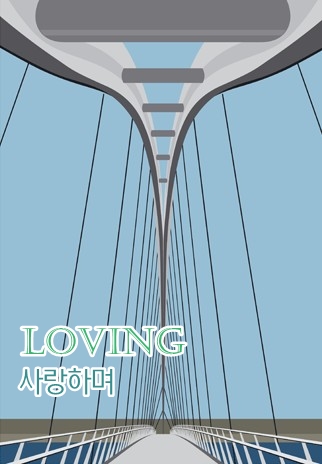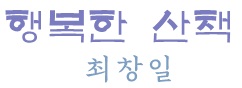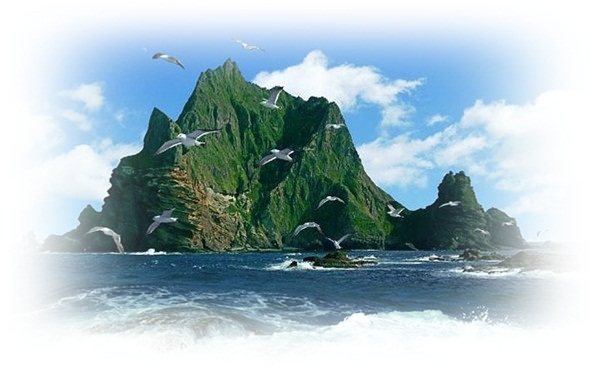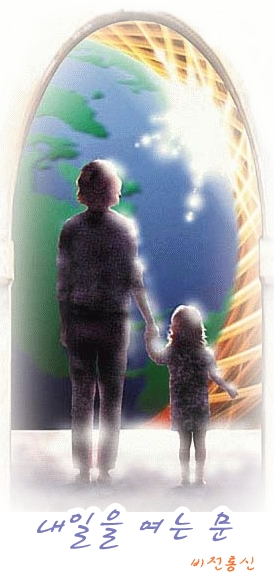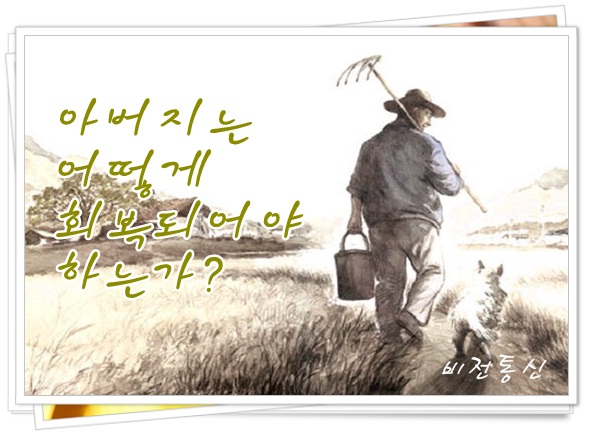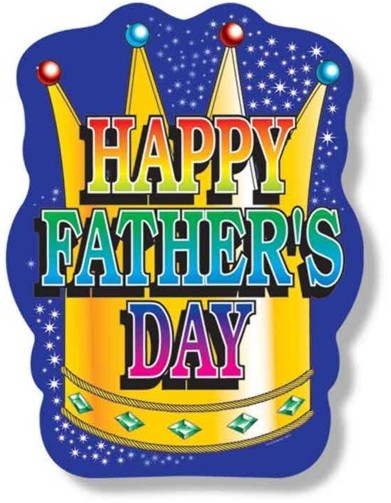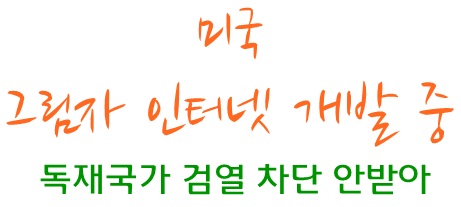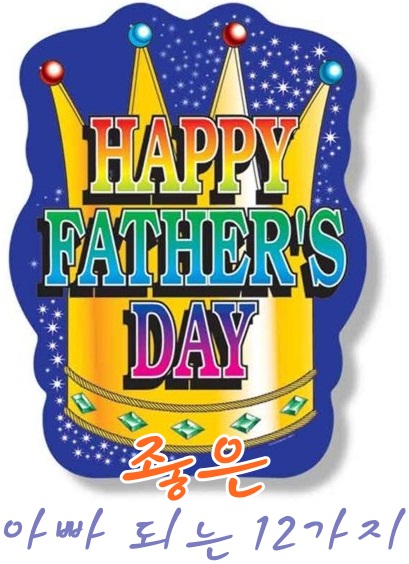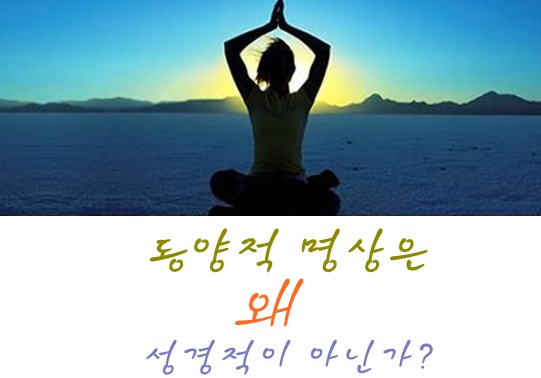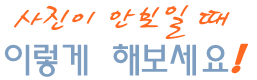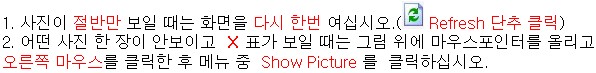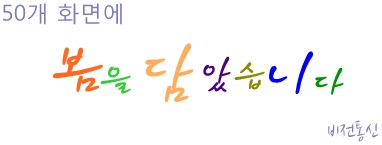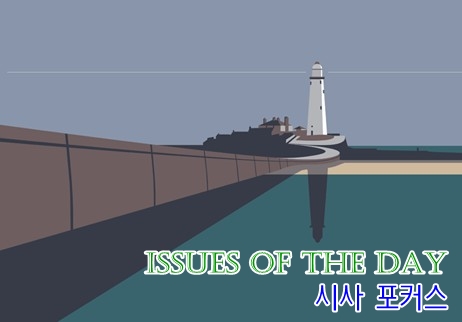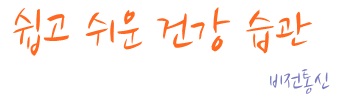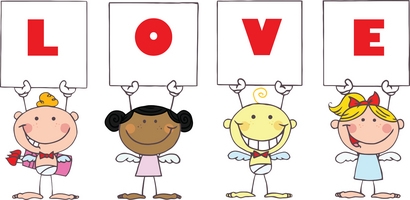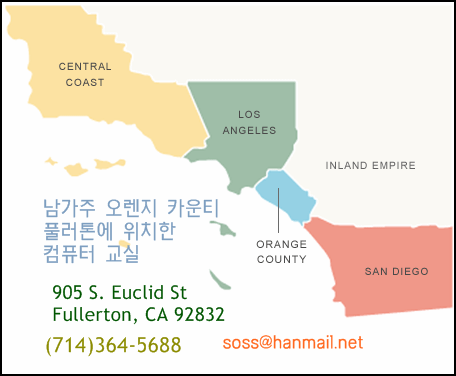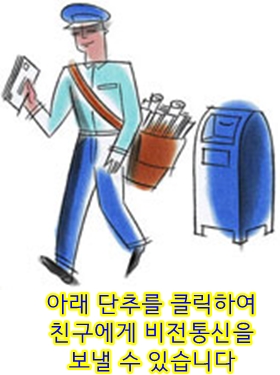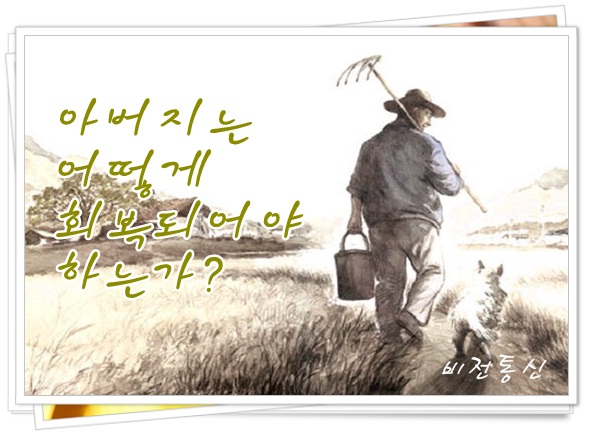
군복무를 하는 한국의 군인들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라고 말하면 [어머니....]라고 크게 외쳐댄다. 나는 [아버지...]라고 외치는
군인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요즘 [왕따가 된 아버지와 놀아주자], [아버지의 기를 살려주자]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존재가치가 그만큼 땅에 떨어졌다는 반증이고 보면 왠지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부모의 은혜를 말할 때면, 아버지보다는 으레 어머니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자석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퀴즈를 하나 냈다.
[여섯 개의 낱말로 되어 있는데, M으로 시작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그게 뭘까요?]
그랬더니 아이들 대부분이 [어머니(Mother)]라고 답했다. 물론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자석(Magnet)]이었다. 어려서부터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역할이 어머니의 몫이다 보니 아이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란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머니는 은혜의 존재로, 아버지는 율법의 존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생각이다.
어머니란 무슨 말이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러나
아버지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요구당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율법적 관계로 보는 데에는 아이들의 성장발달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아이가 태어난 후 몇 년까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동안 아버지의 존재는 어머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와 먼 거리에 있었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다른, 아버지의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즉 아버지는 잘하는 일에는 칭찬을 하고
못하는 일에는 징계를 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에 그의 율법적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성애와 부성애 속에서 자라도록 창조되었다. 모성애는 아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건강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녀일수록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인격장애 또는
성격장애의 가능성도 훨씬 줄어든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처럼 모성애를 제대로 경험한 아이들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볼 줄 알고 남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반면 아버지의 사랑은 아이에게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존재하는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
즉 아버지는 어머니로부터 체득한 무조건적인 사랑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의 질서와 규칙, 규범과 법, 미지와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듯 한 아이가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숙해지는 데는 모성애와
부성애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성장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도 어머니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다. 오히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아버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해밀턴(Hamilton)이라는 아동교육 전문가는 부성실조(父性失調) 환경, 즉 제대로 된
아버지의 역할과 권위 아래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이 모성실조아동(母性失調兒童)보다 훨씬 더 높은 범죄 율을 나타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가정교육에 있어 아버지의 존재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교육비나 대주는 경제적 후원자가 아니라 아이의
정신적, 도덕적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마틴 호프만(M. Hoffman)에 따르면, 자신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더욱 성숙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 역시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의 역할과 기능이 아이의
인격형성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사회의 건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기를 살리자는 외침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아버지 개인이 다시금 힘의 논리에 근거한 봉건적 아버지로 돌아가겠다는 운동은 분명 아니다.
아이를 건강한 인격체로 양육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아버지 본래의 기능, 그 기능적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의 신장도 좋고,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과 배려를 다 쏟아 붓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정작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버지가 없는 [부성부재사회]의 현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아버지의 권위는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권위를 되찾아주자는 사회적 붐을
조성한다고 회복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먼저 아버지 자신이 변해야 한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한다는 사명으로 무장해야 한다.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답기 위하여 날마다
영적이며 도덕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행동모델로서의 아버지의 기능과 역할이 극대화되었을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아이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 대조적인 두 기록이 있다.
아브라함과
엘리 제사장의 경우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이삭에게 철저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족장이 될 수 있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 끝내 홉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마저 비극적인 최후를 맞고 말았다.
엘리가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잘못했는가?
첫째로.. 엘리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지 못했다. 사무엘상 2장
12~17절을 보면 제사를 무시했다고 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이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 삼상 2장22절에 보면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다. 순종을 배워주지 못했다는
말이다.
셋째로.. 자녀를
징계하지 못했다. 삼상 3:13에 보면 엘리는
자식들의 잘못을 징계하여 금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됨]의 회복은 단순한 기 살리기 차원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가 될 것인가, 엘리 제사장 같은 아버지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성서적으로 옳은 결단을 내릴
때만이 [참된 아버지]가 회복될 것이다. (장재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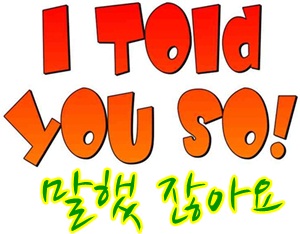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