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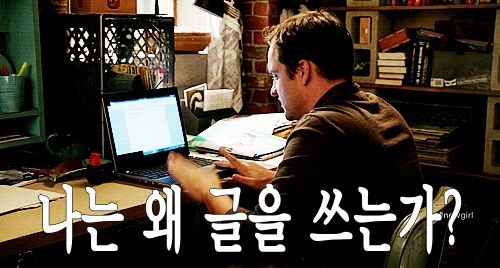
어떤 연구에 따르면 글을 쓰는 작가나 저술가는 일찍 죽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글을 썼다.
남극 정복에 나섰던 로버트 팰컨 스콧 (Robert
Falcon Scott)의 일기는 유명하다.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남극에 다다랐지만 자신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 (Roald
Amundsen)이 벌써 남극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한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스콧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1995년 12월 8일 프랑스의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르-Elle Magazine]의
편집장 장 도미니크 보비 (Jean-Dominique
Bauby)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패션 중심지 파리에서 엘르 편집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화려하고 멋진
삶이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3주 후에 의식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전신마비 상태였다. 몸 전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곤 왼쪽 눈꺼풀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장 도미니크 보비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가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여 15개월에 걸쳐 쓴 책이 바로 [잠수종과 나비](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이다. 이 책이 출간된 지 8일 후에 그는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한다. 생의 마지막까지 그가 한 것은 오직 하나, 글쓰기였다.
혹한의 시베리아 수용소를 경험한 솔제니친(Aleksandr
Solzhenitsyn)도, 나치 치하의 가장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빅토어 크랑클(Viktor Emil
Frankl)도 그 경험을 기록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간, 참혹한 억압을 겪은 인간들 중 상당수가 글로 기록을
남겼다.
사마천은 궁형이라는 끔찍한 형벌을 당하고 평생에 걸쳐 [사기(史記)]를 썼다.
글은 전쟁터에서도 무수히 쓰였다.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조지 오웰과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모두 그 일에 대해 썼다. [카탈로니아
찬가]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유럽의 역사를 바꾼 스페인 내전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감옥 안에서도 걸작들이 쓰였다. [돈키호테]나 [동방견문록] 등이 그런 작품들이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구심점을 잃은 제자들은 흩어져 죽음의 위협 속에 숨어살면서 무엇을
했을까? 복음서를 썼다. 마가, 누가, 마태, 요한. 그들은 모두 글을 썼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그 어떤 참혹하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글을
쓴다.
그럼 나는 왜 글을 쓰는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직업을 묻는 말이다. [나는 목사]라는
입에 붙은 답이 금세 튀어 나온다. 대뜸
[어느 교회목사]냐고 묻는다. [글 쓰는 목사]라고 답한다.
그러면 존경한다는 얼굴의 표정이 좀 덜 한 표정으로 바뀐다.
글 쓰는 일은 은퇴 나이(흔히 65세) 이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나는 기회가 닿는 대로
글을 쓴다. 의무적으로도 쓴다. 단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쓴다.
내가 글을 쓰는 것은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목사는 연극을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것처럼 나는 글을 쓴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고 말씀하셨다. 내가 글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몸부림 침이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은혜를 받거나, 성경을 해석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
글을 쓴다. 은혜가 배가 된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이다. 나는 글을 쓰면서 묵상을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셈이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주의 놀라운 솜씨를 드러낼 수 있다. 나에게
글쓰기는 깊이 있는 묵상을 위한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글을 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자타(自他)가 인정해 주는 화려한
언변(言辯)을 소유하지
못했다. 달변가는 더욱 아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택한 도구는 글쓰기다.
글은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다. 글이라는 매개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 왔는데, 놀랍게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실제로 내가 쓰는 칼럼 형식의 글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친숙한 설교라는 포맷과는 달리,
불신자들도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다.
내 글 속에는 언제나 복음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글을 읽고 당장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릴 수 있게 준비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변과 고민을 말함으로써 성도들이 바른 생각과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말로 직접 소통하는 데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후 11:6).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반면, 직접 만나보면 몸도 유약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찮다 고 비난했다(고후 10:10). 그래서 고린도교회
내에서는 유창한 달변가였던 아볼로(행18:24)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전 1:12).
하지만 아볼로는 한때 유명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바울이 쓴 글들은 지금까지 20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왔다.
그리스도인은 왜 글을 써야 하는가. 글을 쓰는 것 역시 제자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열망이 그를 [글쓰기]로 인도한 것이다.
우리는 글쓰기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일기쓰기를 통해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고,
서평을 통해 사고를 계발하고,
편지를 통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칼럼을 통해 세상을 변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왜 글을 쓰는가? 아니 왜 글을 써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하시니까. 내 안에
주체하지 못할 생명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리고 글 쓰는 것이 내게 생명이고 기쁨이니까.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내가 누렸던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니까. 오늘도 나는 글을 쓰고 있다.(장재언) 

|